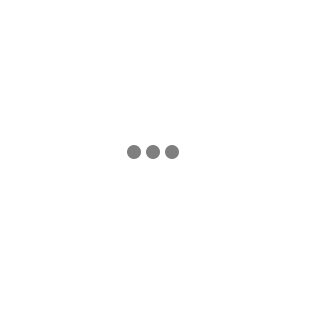그들을 미워했다. 내게 지울 수 없는 성격적 손상과 트라우마를 남기게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 영구적 결함이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된 특성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랬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0은 아니지만 동시에 100 또한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영향은 미쳤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도저히 힘들지만, 어쨌든 나는 그 모든 일이 없었어도 이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재적 천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내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번번히 격하게 으르릉거릴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 그랬어! 나한테 또 그랬어. 아직도 옛날과 똑같아! 하면서 새롭게 분노할 필요가.
난 이제 너무 지쳤다. 아무래도 미워하기에 지친 것 같다. 같은 영역을 맞대고 사는 인간들을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일인 줄 몰랐다. 게다가 그들은 평범한 다른 누군가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뗄레야 떼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아직 그럴 수도 없는, 정말 지겹고 찰거머리 같은 인간들이다. 나는 평생의 반 이상을 그들을 미워하는 동시에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며 갈팡질팡하다 종내는 그런 나를 스스로 격리시켜 문제적 인간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슈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임시방편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정말로 심각해졌다. 나의 관점에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타인들과 어쩔 수 없이 타협하기 위해 만들었던 머릿속 인간 분류표 도서관도 이때만큼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구석에서 스스로 꼬리표를 붙인 채 침묵하는 일은 정말이지 지루하고 괴로웠다. 최악이었다. 거기엔 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라는 한 인간 대신 내가 붙인 분류표만이 팔락거렸다.
이 기록은 지친 내가 남기는 과거와 기억의 편린이다. 지쳐 쓰러지고 이제 막 일어나려 하는 인간이 쓰는 내밀한 진실이자 비밀이다. 단지 나 스스로를 지탱하고 품고 있기에는 버거웠던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자 함이다.
불에 데인 자욱처럼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겠지만 세월이 가고 나를 보살필수록 옅어지리라 믿는다. 살이 움푹 패인 자리에도 어쨌든 새 살은 차오르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