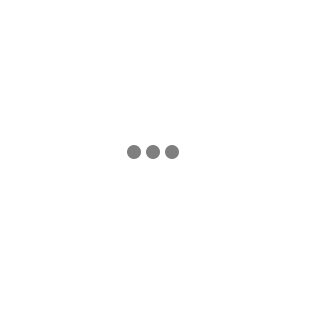그 때가 나의 가장 오래된 무기력의 기억이다.
통렬하고 깊게 남은 기억이다.
아무리 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내 안의 무언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겨우라면 겨우라고 할 수 있는,
단 다섯 대의 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때의 참담함과 무력함, 기타 등등의 감정들은 여전히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난 그 순간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떠나보냈다.
그 후로 내 내면의 많은 부분에는 '어쩔 수 없다'는 단어가 자리잡았다.
상처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잘못 되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런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다. 그저 받아들일 뿐.
왜 맞았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억울함이 들끓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왜 맞아야 하지?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했나? 단지 숙제를 좀 덜 하고 이미 공부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아니면 맞기 싫어서 둘러댄 것들이 오롯이 내 죄가 되어서?
맞기 싫어서 길길이 날뛰고 내 주장을 펼쳐도 돌아오는 건 결국 매였고 난 어쨌든 아프기 싫었으므로 결국은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빌었다.
그렇지만 딱히 경감되는 건 없었던 것 같고 마음먹은 대로 다 때린 다음 꼭 'ㅇㅇ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낸다' 는 식의 문구가 따라왔다.
나는 부당함과 불의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성향이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나는 어쨌든 굴복했다. 불만과 억울함이 들끓는 내면을 감추며 앵무새처럼 용서를 빌었고 그렇다고 경감되지도 않은 처벌에 감사하며 돌아와야만 했다. 그리고 며칠간 의자에 앉을 때마다 혹은 다리를 펼 때마다 피멍을 느끼며 살았다.
가끔 막대기 같은 걸로 상체를 콱 찔리거나 발로 채였을 때는 거기에 멍이 들어 한동안 숨쉴 때마다 아팠고 팔을 들어올릴 때마다 어깨가 아팠다.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한 지 벌써 1년.
내 안에 들끓는 분노를 깨달은 지 10년.
그걸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지는 6년.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것에 잠식되어 있다는 걸 안 지 2년.
나는 그 2년간 선생님과 수많은 얘기를 하며 겨우 기나긴 터널을 벗어났다.
그렇게 한 편으로는 조금이나마 그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내 안에 정립되지 못했던 증오와 사랑을 겨우 바로잡을 수 있었다.
나는 대학을 입학할 무렵 받았던 그의 편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버렸다.
얼핏 기억하기로는 대충 지난 시간에 대한 사과와 용서의 내용이었다.
학부모들과 무슨 사찰에 다녀와 그런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당시의 나는 마음 한 켠이 아프면서도 한 편으로는 코웃음을 치며 그 편지를 접었다.
당신은 과연 그 시간들이 내게 미친 영향을 알까?
어렴풋하게 헤아리나마 그 거대함을 차마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 없이 그것을 버렸다.
당신의 마음아픔을 헤아려 주기에는 너무도 나의 것이 커다랗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으므로.
지금은 이해하고 용서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애정이었음을 인정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나는 가끔 이렇게 사로잡혀 그 곳에 있는 과거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나는 정말 가끔은 묻고 싶다.
매로 때리는 건 그렇다 쳐도 왜 종종 날 걷어차고 그렇게 대해야만 했어?
사랑했다면, 누구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며 키운 자식이라면
어떻게 그 누구보다 낮은, 마치 길바닥에 붙은 껌딱지만도 못한 지저분하고 가치없는 것처럼 그렇게 날 대할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바닥에 쓰러진 채 발로 걷어차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감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열기로 결심한 지금도 당신과 나 사이에 놓인 불가해이다.